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The second week
- 신화가 현대문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 -

♠ 한국에 창세신화가 있는가?
• 창세신화 :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그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
• 창세신화는 세계 신화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이다. 우리에게 창세신화가 있었던가? 아니 신화가 있었던가?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시조를 숭앙하는 신화이다. 「단군신화」는 조선 후기 반존화적 도가사상을 시작으로 무장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이후 박정희 정권에 와서는 식민사고를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천황 숭배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신화를 일본의 그늘아래에 놓고 말았다.
• 「단군신화」 같은 건국신화 : 나라의 시조 내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에 나라의 시조를 한껏 숭앙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 「그리스․로마 신화」 : 인간과 사물에 얽힌 다양한 사건을 보여 주기에 다채롭게 구성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가 있는가? 그렇다.
⑴ 문헌에 정착된 건국시조신화
⑵ 문헌에 정착된 여산신과 남신의 신화
⑶ 문헌에 정착된 성씨시조신화
⑷ 구전으로 전해지는 예사신화
⑸ 구전으로 전해지는 당신신화
⑹ 무당 노래로 전해지는 일반신의 신화
⑺ 무당 노래로 전해지는 당신의 신화
⑻ 무당 노래로 전해지는 조상신의 신화
• 「그리스․로마 신화」는 이른 시기에 문헌으로 정착되고 신전에서 노래하던 것이 중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더 이상 구연되지 않는 죽은 신화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화는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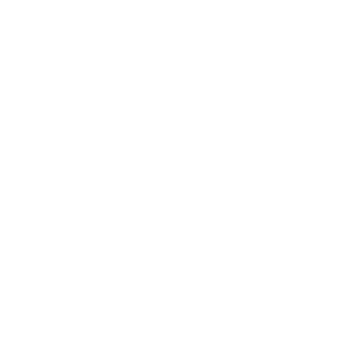
♠ 한국의 창세신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창세신화의 신화소
A. 천지개벽 :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나뉘는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소
B. 창세신의 거신적 성격 : 거인의 면모를 지닌 창세신의 외모를 묘사
C. 물과 불의 근본 : 음식을 익히기 위한 불과 인간에게 긴요한 물을 마련
D. 인간창조 :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벌레, 흙
E. 인세차지경쟁 : 인간 세상이 신들의 동경 대상이 된다는 것
F. 일월조정 : 세상을 관장하는 신이 현재와 같이 두 개인 해와 달을 조정
G. 사냥, 화식, 수목, 암석 등의 기원 : 실생활과 관계있는 것들에 대한 근원 묘사.
H.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의 출생 : 하늘의 남신과 땅의 여신이 결합해서 인간세상의 시조를 낳는다는 내용. 고구려 신화에서 해모수가 지상에 내려와 유화와 관계해서 주몽을 낳는 신화와 비슷하나, 창세신화는 이승과 저승의 주인이 되고, 고구려 건국신화는 나라의 시조가 된다.

♠ 창세신화소에 따른 해석
1. 천지개벽
|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彌勒님이 誕生한즉,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늘은 가마솥의 뚜껑처럼 도드라지고, 땅은 네 구석에 구리 기둥을 세우고, |
• 중국의 반고신화(盤固神話)에서도 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 첫째, 미륵의 거인적 면모를 볼 수 있다. 천지분리를 위해서 네 귀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우는 것에서 확인된다.
둘째, 천지의 생성과 개벽 및 미륵의 탄생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 원초적 생성에 이은 제2의 행위자가 존재하는 신화는 흔히 진화론적 관점을 유지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2. 창세신의 거신적 성격
| 彌勒님이 옷이 없어 짓겠는데, 옷감이 없어, 이 山 저 山 넘어가는, 뻗어 가는 칡을 파 내여, 벗겨 내어, 삼아 내여, 익혀 내여, (중 략) 불 안 넣고, 생 낟알을 잡수시고, 彌勒님은 섬들이로 잡수시고, 말들이로 잡숫고, 이래서는 못할 일이니라. |
• 미륵님의 거인적 면모를 몸집이 커서 큰 옷을 마련해 입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후대의 <베틀노래>에서 거듭 등장한다. 또한 대식의 요인이 보인다.
3. 물과 불의 근본
| 내 이리 誕生하야, 물의 根本 불의 根本, 내 밖에는 없다, 내여야 쓰겠다. (중 략) 한즉, 쥐말이, 금덩山 들어가서, 한짝은 차돌이오, 한짝은 시우쇠요, 툭툭 치니 불이 났소. 소하山 들어가니, 샘물 솔솔 나와 물의 根本. 彌勒님, 水火根本을 알았으니, 人間 말하여 보자. |
•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사례에서 불을 훔친 행위가 나타나서 불에 관한 신화적 요소가 보이고, 물에 관한 신화는 홍수신화로 한정된다.
• 물과 불이 미륵에 의해 찾아지는 점으로 물과 불은 창조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 탐색의 주체는 미륵, 찾는 방식은 형틀에 생물을 올려놓고 매를 때려 묻는 점, 불과 물은 각기 충격의 원리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인간창조
| 옛날 옛時節에, 彌勒님이 한짝 손에 銀쟁반 들고, 한짝 손에 金쟁반 들고, 하늘에 祝詞하니, 하늘에서 벌레 떨어져, 金쟁반에도 다섯이오 銀쟁반에서 다섯이라. 그 벌레 내려와서, 金벌레는 사나이 되고, 銀벌레는 계집이 되어, 銀벌레 金벌레 자라나서, 夫婦로 결합하여, 世上사람이 나왔더라. |
• 인간창조의 신화소가 일월과 연결된 점과 근친상간의 문제가 미해결-<해와 달이 된 오누이>-<해와달이된오누이>
• 미륵이 능동적이지 않고 상위의 신격에 의존.
• 금쟁반과 은쟁반은 해와 달을 상징. 남성과 여성이 됨.
• 근친상간은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데 이는 인간의 창조 후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와 인간은 애초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5. 인세차지경쟁
| 彌勒님 歲月에는, 섬들이 말들이 잡숫고, 人間歲月이 太平하고. 그랬는데, 釋迦님이 내려와서, 이 歲月을 앗아 빼앗고자 하니, <중 략> 네 歲月 될라치면, 三千중에 一千居士 날 것이다. 歲月이 그런즉 末世가 된다. |
• 제주도 지역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로 변이.
• 첫째 대결 : 금병에 금줄 달고 은병에 은줄을 달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미륵의 승리는 수렵, 어로, 채취의 자연적 생활로 힘이 센 사람이 승리. 또는 넋건지기 시합으로 주술적 권능에서 미륵이 우세.
• 둘째 대결 : 자연 채취의 단계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자연 기후 조절에 대한 시합. 미륵이 주술적 권능에서 앞섬.
• 셋째 대결 : 모란꽃의 중등사리를 꺾어 옮긴 것은 생명의 전이가 아니라 죽음이다. 식물의 죽음은 곧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의미. 또한 열매의 수확과 씨앗의 획득을 의미. 속임수 속임수에 의한 경작 원리가 시작됨.
• 석가의 승리는 생명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아는 경작재배의 단계인 문화적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
• 석가가 평가 절하된 것 : 인간의 유한성과 악의 전횡을 석가 쪽에 책임 지우기 위해.
• 인세차지경쟁신화소는 이승과 저승의 분리라는 우주적 차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6. 일월조정
| 그때는 해도 둘이요, 달도 둘이요. 달 하나 띄어서 北斗七星 南斗七星 마련하고, 해 하나 띄어서 큰별을 마련하고, 잔별은 百姓의 直星별을 마련하고, 큰별은 임금과 大臣별로 마련하고. |
• 서양에는 태양이 복수로 등장하지만 우리의 경우 일월이 복수.
• 일월의 조정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일월조정, 인간창조, 물과 불의 근원이 항시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
7. 사냥, 화식, 수목, 암석 등의 기원
| 그러던 三日만에, 三千중에 一千居士 나와서, <중 략> 그 중 둘이 죽어 山마다 바위되고, 山마다 솔나무 되고. |
• 석가가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불이라는 매개항이 개입되면서 산 것을 죽여서 음식으로 만든다는 의미. 유한한 존재가 벌이는 행위.
• 그런데 두 거사가 고기를 먹지 않고 무한성을 획득하겠다고 한다. 유한한 존재이기를 거부하고 무한한 존재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차로 획득하는 것이 소나무와 큰 바위이다.
8.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 출생
• 제1대 천부지모와 제 2대 시조 출생이라는 공식은 건국신화나 무속신화의 구조와 직결된다.
• 창세신화에서 건국신화로 전이되는 모습이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