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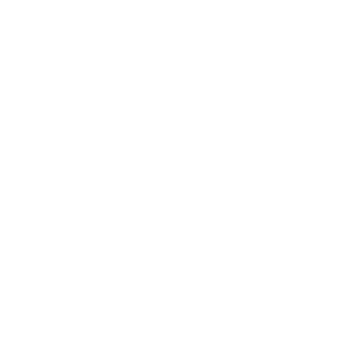
◆ 고고학과 계보학의 관계
고고학과 계보학의 관계는 정역학과 동역학의 관계와 유사하다. 정역학은 하나의 역학적 체계에서 그 체계의 평형을 지탱해 주는 힘들의 구조를 탐구한다. 반면 동역학은 그 힘들의 체계가 변환될 때 그 변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힘들의 변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고학은 담론들의 형성과 변환을 기술하고자 한다.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보학은 담론들의 형성과 변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층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힘들의 역학관계를 통해 그러한 변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명이란 원인을 요구하며 이 원인이 푸코에게는 권력이다.
고고학이 지식-권력에서 지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계보학은 권력의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푸코의 권력의 개념
① 인식론 : 설명되는 것과 설명하는 것을 구분한다. 푸코에게 있어 권력이란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즉 푸코에게 권력은 설명하는 것, 동인(動因)으로 규정된다. 권력이란 다른 것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기보다는 그 자체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② 존재론 : 권력은 ‘무엇’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누군가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푸코에게 권력이란 전략이요, 관계요, 기능이다. 권력의 존재론적 지위는 (넓은 의미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을 서로 관계 맺게 하는 어떤 힘의 기능이다. 그것은 전략적위치들의 집단적인 효과이다.
③ 가치론 : 진위의 구분이란 권력이 담론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진위의 구분이란 포코가 언제나 문제시하는 나눔과 배제의 역학의 일종인 것이다. 푸코는 과학/이데올로기라는 양분법을 거절하고 지식 또는 담론이라는 중성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는 지식의 근저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과 욕구의 놀이를 즉 ‘앎에의 의지’를 문제삼는 것이다. 푸코에 잇어 진과 위의 양분법이야말로 지식의 근저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과 욕구의 놀이를 은폐하는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지식을 그 자체로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지식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진위의 양분법 구도를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담론의 질서에서 권력은 다분히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감시와 처벌에 이르면 이제 권력의 생산적 성격이 강조된다. 그래서 권력은 억압하기보다는 생산하고, 권력은 이데올로기화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진리가(眞理價)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푸코의 이데올로기 개념
① 진리/이데올로기의 양분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거부한다. 진리/이데올로기란 차라리 진리가 지니고 있는 두 양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②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주체라는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권력의 작동을 심리적인 차원으로 끌고 감으로써 우리는 의식철학적, 주체철학적인 질곡으로 다시 몰고 갈 위험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푸코에게 이데올로기 개념이 지니는 이러한 측면은 단호히 거부된다.
③ 특히 맑시즘에서 경제적 결정 요인에 비해 부차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푸코에게는 지식 속에서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능동적인 양태이며 진리에 의해 조작되는 일차적인 동인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 권력의 기능
권력의 기능은 언제나 작용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 작용점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푸코의 대답은 바로 인간의 신체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시와 처벌 및 앎에의 의지에서 지식, 권력, 신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세 항들로 다루어지게 된다. 서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식과 권력, 권력의 작용점으로서늬 신체 그리고 근대 훈육적 사회의 필수 조건으로서 개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지식이라는 삼자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석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푸코는 신체를 논하면서 고전시대에 신체는 권력의 직접적인 작용점이었으나 근대에 들어와 권력의 작용점은 정신이 되고 신체는 그러한 작용의 필수적인 상관자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감시와 처벌]과 [앎에의 의지]
19세기 이래 권력과 지식의 관계는 각별한 것으로서 고정된다. 죄인을 다루고자 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식을 필요로 했고 감옥을 둘러싸고 축적되는 지식들은 그 밑바탕에서 행사되는 권력의 작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권력 관계는 특히 형벌이 순화되기 시작하고 죄인들의 신체와 정신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19세기 이후의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성(性)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푸코는 전통적으로 견지되어 온 억압가설을 비판하고 권력은 성에 대한 진리가를 끊임없이 창출함으로써 성을 조작해 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권력이 성을, 신체를 어떻게 억압하고 은폐하는가의 문제보다는 권력이 성적 담론들을 통해 어떻게 신체로부터 수많은 비밀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푸코는 범죄의 예와 성의 예를 통해 서구 근대 부르조아 사회에서의 권력과 지식의 유착관계, 그리고 신체와 정신 에 가해졌던 권력의 조작과 이 조작을 뒷받침했던 인간과학들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